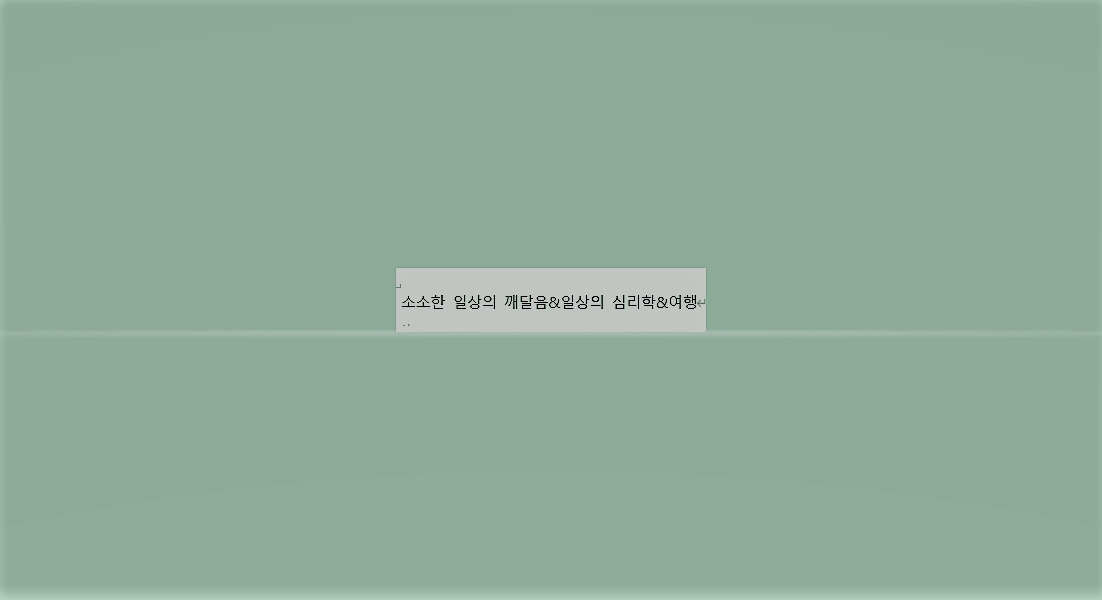나는 40대 중부터 갱년기 증세가 서서히 신체적으로 먼저 나타났다. 늘 규칙적이었던 생리가 언제부터인가 주기가 짧아지더니 생리양도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몸의 온도 변화도 일정하지 않았다. 갑자기 오한이 나든지 아니면 더워서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2년마다 체크하는 정기 신체검사에서는 고지혈증이 나타났다. 중성지방과 LDL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서적 변화도 함께 왔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감정선이 일정하지 않고 심하게 파도를 치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남편이 무지막지하게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단 남편의 행동이 나의 감각을 자극하였다. 그가 밥 먹으면서 내는 음식 씹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시도 때도 없이 껴대는 방귀 소리도 혐오스러웠으며 쉬는 날이면 종일 TV앞에서 스포츠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도 꼴 보기 싫었다. 나는 남편이 미워질 때면 내 온몸에 있는 기를 눈에 다 모아서 그의 뒤통수에다 레이저를 쏘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당황스러움과 좌절감이 컸다. 그러면서 정체성 혼란도 함께 왔다. 주변에서만 들어왔던 제2의 사춘기가 나에게도 본격적으로 왔지만 매일 출렁이는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 어떻게 파도를 타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절망을 느꼈다. 또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우울해졌다.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갱년기’로 옮겨갔다. 친구도 나 못지않게 이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도 나처럼 남편하고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이었다. 친구 남편이 너무 힘들었던지 친구한테 그랬단다. “갱년기가 아니라 개년기라고!”하면서 “어서 지나가야지, 너무 괴롭다고 하더란다”.
에릭슨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프로이트와 에릭슨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이 청소년기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반면 같은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은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 변화와 성장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에릭슨은 영아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친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발달을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에릭슨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 전 생애에 걸쳐 나이별로 해내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 연령대로 과제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반항과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모르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발달단계에 따라 주어지는 과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7단계 특징
에릭슨의 발달단계 이론에 의하면 나는 현재 7단계인(41세~65세, 장년기): ‘생산성 대 자기 침체’를 지나고 있다. 7단계의 과제는 윗세대를 부양하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도록 도우면서 자신이 일구어 낸 일, 양육, 관계 등에서 업적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생산성이 결여되고 불만족으로 침체를 가져온다. 인생은 회의감에 빠지고 자기 침체에 빠져 우울한 장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 시기에 던져야 할 존재론적 질문은 나는 내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이다.
현재 나의 발달 단계는
나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본다. 에릭슨 발달이론에 의하면 나는 과업을 꽤 잘 해낸 사람이다. 왜냐면 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을 내면서 사회의 이바지하며 잘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리 힘든 것일까? 허탈함, 상실감, 무기력함, 좌절감, 우울감이 나의 중년기의 주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 나의 삶의 무대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나를 돌보고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늘 타인을 돕고,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느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사랑했다. 거기에서 만족감을 크게 얻었다. 그러데 나이가 들어 보니 내 속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팅 빈 가슴뿐이었다. 진정한 생산성의 업적이 아니었다. 나의 삶에 내가 우선되지 않은 생산성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 성과는 ‘허무’라는 이름으로 남겼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아니다! 때로는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이기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나서야 깨달았다.
융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 중반부터는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도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끊임없이 일에 몰입하는 것은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지금은 매일 용기를 내어 나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있다.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일상에서 만나는 심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 삶의 깨진 유리창 (1) | 2023.01.05 |
|---|---|
| 억압(repression) (0) | 2022.12.30 |
| 심리학 관점에서 보는 영화 ‘가스등’ 인물 분석하기 (2) | 2022.12.24 |
| 가스라이팅(Gaslighting) (2) | 2022.12.24 |
| 상호의존증(Co-Dependency) (2) | 2022.12.24 |